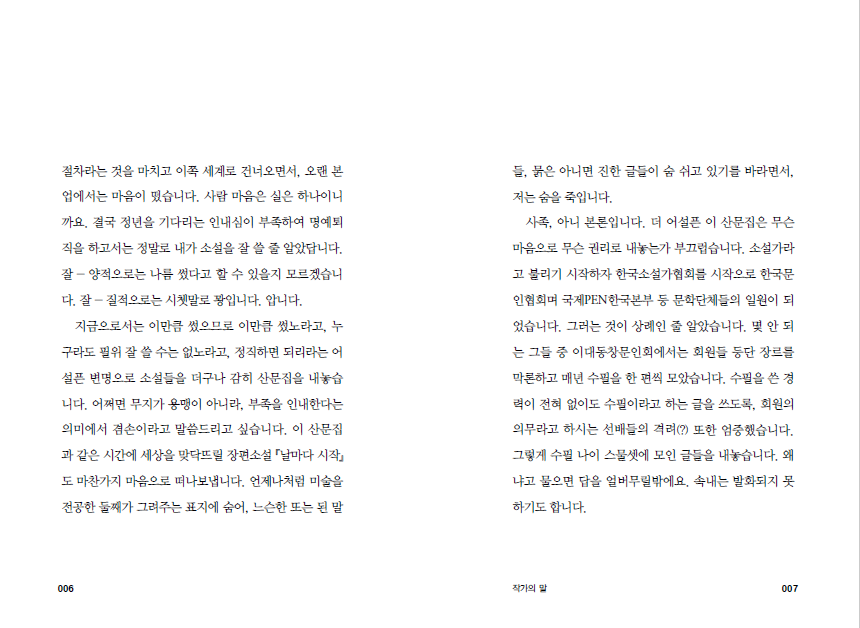입시지각생의 운동화 끈
『우리 어디에 서 있어도』2002 (이화에세이)
해마다 겨울이 오고 수능이든 입학시험이든 결정적인 시험이 있는 날은 대개 날씨가 혹독한 것 같다. 실제로 그러한지 모두들 마음이 얼어붙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기억들이다.
오전의 논술과 오후의 면접, 그만하면 교수에게나 입시생에게나 긴장된 하루가 틀림없다. 차가 밀렸다가는 큰 일이므로 학생들이 움직이기 아예 전에 서둘러야 마음놓고 학교에 이른다. 신체리듬에 따라 참새형과 올빼미형이 있다지만, 나는 새벽같이 출근할 날이면 아무리 마음을 풀어도 짜증을 이기지 못한다. 입실 시간이 지나고도 빈자리가 꽤 있었다. 입시가 여러번의 지원기회가 있어서, 첫 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은 예상대로 대개 결시로 이어질 것이다. 시험시작 종이 울리고, 우리는 서서히 원서대조에 들어갔다. 삐그덕 교실 문이 열리고, 놀라서 고개를 든 학생들 앞에 울상으로 지각생이 나타났다. 시계를 보니 10분 정도 지나 있었다. 규정대로 라면 입실이 거부될 상황이었다. 새벽부터의 짜증까지 겹치면 지각생이 불리하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상념은 불현듯 아득한 옛날로 돌아간다.
수십년 전 어느 이른 봄, 선배도 없는 외로운 대학시절은 신설독문과 신입생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자라서 처음 외지로 나간 지방도시 출신에게는 대도시의 낯설음까지 더했다. 낯설기야 어디 그 봄부터였었나? 입학시험을 치르던 꽁꽁 언 겨울, 백설공주가 숨어사는 산만큼이나 오르락내리락 미로를 거쳐가는 캠퍼스는 주눅들게 하기 알맞았다. 오늘날에 보아서는 그저 아기자기한 정도라 해도, 당시의 시골소녀의 눈에는 그랜드 캐년 다름없었다. 약간 비뚜름히 오른쪽으로 산을 오르다가 어디에선가 왼쪽으로 굽어 내려가다 보면 오른 쪽 아래로 펼쳐지는 거대한 건축물, 보기는 무맛이었고 우중충한 색조마저 사람을 얼어붙게 하는데... 거기서도 어렵게 몇 고개를 올라 드디어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파김치 다름없었다. 종일 7과목을 필기과목으로 치르는 입시에 겁도 났고, 하루 종일은 그 자체로서 부담이었다. 어떻게든 숨을 돌릴 수 있는 점심시간은 축복이었다. 어머니는 시골어머니답게 따뜻한 맛있는 점심을 자꾸 더 뜨게 했고, 가물거리는 눈...
다시 시험장을 향하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더 무겁기만 했다. 시간은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잡았지만, 들어갈 때는 오르막이라는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오르막길에서 운동화 끈 한쪽이 풀렸다. 끈은 걸기적거리며 안팎으로 덜렁거렸다. 당연히 몸을 굽혀서 끈을 매어야 했겠지만, 미욱한 성정에 몸을 굽힐 시간이 없기도 했고, 몸을 굽혀서 버릴 1,2분과 끈이 풀려서 방해받을 1,2분 사이를 계산하는 머리는 실타래같이 얽히기만 했다. 누구도 실험을 해 보지 않은 두 가지 경우를 두고서 머리 속으로 계산을 한다? 그것이 터무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생각은 그 둘 사이를 헤맸고, 걸기적거리는 발은 자동적으로 옮겨 떼고 있었다. 시험장 건물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흘끗 바라본 시계로 이미 시작 시간이 지나있었다. 이 길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소원으로 지원대학을 바꾼 분풀이로서 도중하차했다는 누명을 쓸 게 뻔했다. 이제는 지각을 해도 일단 고사장에 갈 것인가 아닌가의 투쟁이었다. 계단에 이르러 넘어진 것은 꼭 풀린 끈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르막만 나타나도 피를 품어내기에 지쳐버리는 심장이 진짜 범인이었을 것이다. 고사장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5분도 더 지난 상태... 아 이렇게 두 학교를 다 놓지는 구나. 층계를 올라온 가슴은 콩콩 뛰다 못해 겨울 두터운 옷 위까지 벌렁거리고 있었고, 시계는 째각거렸다. 이 벽 너머, 바로 벽에 밀착된 책상 하나에 응시학생이 없구나...
우연이었을까? 시커먼 문이 열리고 하얀 단정한 얼굴이 나타났다. “봐요, 학생, 여언가요?”
아니 다시 쓰자. 나는 문을 붙잡았다. 숨을 몰아쉬고, 시간이 흘렀다. 눈을 떴다. 문을 조금 열었다. 시커먼 문이 열리고 하얀 단정한 얼굴이 나타났다. “봐요, 학생, 여언가요?”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빈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와서 문이 안에서 열렸는지, 밖에서 열렸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많은 세월 동안 그 순간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버전으로 쓰이던 그 장면이 원본을 잊어버린 것이다. 분명한 것은 손수 그 빈 책상을 가리키시며, 나를 앉게 하신 교수님의 엉거주춤한 행동이었다. 덮혀있던 시험지를 뒤집어 글자를 올려놓으시기까지 했다.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구나... 나는 까막눈 비슷했다. 놀람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시험지는 뿌옇게 변해갔다. 그렇게 치른 5교시 과목은 공교롭게도 전공이었다, 독문과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그렇게 해서 나는 지각생을 내치시지 않은 교수님 덕으로 이화식구가 되었다. 60년대 학부, 70년대 대학원, 80년대 박사과정을 이화에서 공부하면서, 그 시발점에는 지각생을 내치시지 않은 교수님이 계신 것을 상기하곤 했다. 오늘 이렇게 입시에 늦는 학생이 있으면 더욱 그렇다. 꼭 선생님을 본받으려는 생각에서는 아니겠지만, 지각생에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다. 사실은 내가 교단에 선 이래 결석생을 결코 홀대하지 않는 숨은 이유 또한 선생님께서는 짐작도 못하실 비밀로 남아 있다.
지난 학기에는 모교의 학위논문 심사에 합류해서 감시회로까지 갖춘 현대식 교수실을 드나들며, 그 옛날 칸막이 교수실의 사랑 반만이라도 나의 제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지 새삼 코끝이 찡했다. 아슬아슬한 입학 후 여전히 지각 결석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어주시던 강희영교수님, 김영호교수님도 이화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정년하신지 오래이다. 너무 오랜 동안 배워서 다 베껴먹은(?) 이병애교수님마저 이제 곧 교정을 떠나시게 된다니, 내년 이맘때의 모교가 얼마나 썰렁할까.